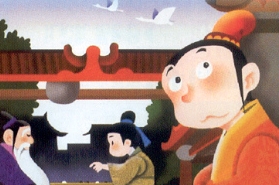| 故事成語- 마중지봉 麻中之蓬 | |
| 입력시간 : 2009. 07.09. 00:00 |   |
|
☞구부러진 쑥도 삼밭에 나면 자연히 꼿꼿하게 자란다. 사람도 주위환경에 따라 선악이 다르게 될 수 있음.
[유]근주자적(近朱者赤)·근묵자흑(近墨者黑), 귤화위지(橘化爲枳)·남귤북지(南橘北枳),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출전]《순자(荀子)》〈권학(勸學)〉편
[내용]"서쪽 지방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은 사간(射干)이다. 줄기 길이는 네 치밖에 되지 않으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자라 백 길의 깊은 연못을 내려다 본다.
이는 나무줄기가 길어서가 아니라 서 있는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쑥이 삼 밭에서 자라면 붙들어 주지 않아도 곧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함께 검어진다-(中略)- 이런 까닭에 군자는 거처를 정할 때 반드시 마을을 가리고(擇), 교유할 때는 반드시 곧은 선비와 어울린다. 이는 사악함과 치우침을 막아서 중정(中正)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다."
마중지봉은 윗 글의 "봉생마중 불부이직(蓬生麻中 不扶而直)"에서 취한 것이다. 앞의 "봉생마중"을 그대로 쓰기도 한다. 쑥은 보통 곧게 자라지 않지만, 똑바로 자라는 삼과 함께 있으면 붙잡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삼을 닮아 가면서 곧게 자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하찮은 쑥도 삼과 함께 있으면 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니, 사람도 어진 이와 함께 있으면 어질게 되고 악한 사람과 있으면 악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환경이 중요함을 함축한 말이다.
[원문]蓬生麻中 不扶而直 白沙在涅 與之俱黑
[참고]삼은 또한 밀식해서 심으면 곧장 하늘로 뻗으면서 자란다. 이런 사실은 옛날 유학자들의 많은 교훈거리로 되어 왔다. 친구,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의 '마중지봉(麻中之蓬)' 이란 말이 있다. 삼밭에 난 쑥이란 뜻이니까, 삼밭이 쑥대밭이 된 것이 아니냐고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음미해야 할 말이다. 쑥은 무릎 정도로 자라는 것이 보통이지만 쑥이 삼밭에 났을 때에는 삼과 똑같이 자란다.
삼이 한자 자라면 쑥도 한자 자라고, 삼이 여섯 자 자라면 쑥도 여섯자 자라난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쑥대와 삼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즉, 마중지봉이란 말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주위의 감화를 받아 선량해 진다는 말이며, 여기에서 삼은 좋은 친구, 좋은 환경을 말하고 있다.
■ 마혁과시 馬革寡尸 [말 마/가죽 혁 / 쌀 과 / 주검 시]
☞말가죽으로 시체를 싼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장(勇將)의 각오
[출전]『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
[내용]후한(後漢) 광무제 때의 명장 마원이 교지(交趾)와 남부지방 일대를 평정하고 수도로 귀환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 중 지모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맹익이 판에 박은 듯한 인사말을 하자 마원은 맹익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 노박덕(路搏德) 장군이 남월(南越)을 평정하여 큰공을 세우고도 작은 영토를 받는 데 불과 했는데 나는 큰공을 세우지도 못했는데도 공에 비해 상이 너무 커 이 영광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두렵다.
지금 흉노와 오환(烏桓)이 북방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들을 정벌해야 한다. 사나이는 마땅히 전장에서 죽어야 하고 말가죽으로 시체를 싸서 장사지낼 뿐이다
■ 막고야산 莫姑野山 [말 막/잠시 고/들 야/뫼 산]
☞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선들이 사는 선경. 북해 속의 신선이 사는 산, 무위의 도를 갖춘 자유인이 사는 곳
[주]莫=邈 (멀 막/ 아득할 막)
[출전]『장자』 추수 편
[내용]도를 터득한 현인 견오가 연숙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접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네만, 글쎄 그게 너무 터무니없고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았지 돌아올 줄을 모르더군. 나는 그 이야기가 은하수처럼 한없이 계속되는 것 같아 그만 오싹해졌네. 너무도 차이가 있어 상식에 어긋나네." 연숙이 물었다. "그 이야기란 어떤 건가?" 견오가 대답했다.
"막고야산에 신인이 살고 있지. 그 피부는 얼음이나 눈처럼 희고, 몸매는 처녀같이 부드러우며 곡식은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몰아 천지 밖에서 노닌다네. 그가 정신을 한데로 집중하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병들지 않고 곡식도 잘 익는다는 거야. 이야기가 하도 허황되서 믿어지지가 않네."
연숙이 말했다. "그렇군. 장님에게는 색깔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고 귀머거리에겐 음악의 황홀한 가락이 안 들리지만, 장님이나 귀머거리는 육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세. 지식에도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네. 그게 바로 지금의 자네를 말하네. 신인의 덕은 만물을 섞어 하나로 만들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가 천하를 다스릴 것을 바라고 있으나, 그가 무엇 때문에 애써 수고하려 하겠나?. 이러한 신인은 외계의 사물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고 홍수가 나서 하늘에 닿을 지경이 돼도 빠지는 일이 없으며, 큰 가뭄으로 금속과 암석이 녹아 흘러 대지나 산자락이 타도 뜨거운 줄 모르네. 신인은 그 몸의 먼지나 때, 쭉정이와 겨로도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요나 순을 만들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천하 따위를 위해 수고하려 하겠는가." 장자가 말하고 있는 막고야산은 바로 무위의 도를 갖춘 자유인이 사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 막역지우 莫逆之友 [말 막/거스를 역/어조사 지/벗 우]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스리는 일이 없는, 死生을 같이할 수 있는 친밀한 벗.
[유]竹馬故友(죽마고우)/,斷金之交(단금지교) /.金蘭之交(금란지교)./芝蘭之交(지란지교)/.知己之友(지기지우)./知音(지음)./刎頸之交(문경지교)./水魚之交(수어지교)./膠漆之交(교칠지교)-아교와 옻처럼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관포지교(管飽之交)-관중과 포숙아의 고사
[출전]『莊子』
[내용1]자사(子祀)와 자여(子輿)와 자리(子犁)와 자래(子來) 이렇게 네 사람은 서로 함께 말하기를, "누가 능히 無로써 머리를 삼으며, 삶으로써 등을 삼고, 죽음으로써 엉덩이를 삼을까? 누가 사생존망(死生存亡)이 한 몸인 것을 알랴! 우리는 더불어 벗이 되자." 네 사람은 서로 보고 웃었다.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드디어 서로 벗이 되었다.
子祀 子輿 子犁 子來 四人相與語曰 孰能以無爲者 以生爲背 以死爲尻 孰知死生存亡之一體者 吾與之友矣 四人相視而笑 莫逆於心 遂相與爲友.
[내용2]자상호(子桑戶)와 맹자반(孟子反)과 자금장(子琴張)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더불어 말하 기를, "누가 능히 서로 더불어 함이 없는데 서로 더불어 하며, 서로 도움이 없는데 서로 도우랴. 능히 하늘에 올라가 안개와 놀며, 끝이 없음에 날아 올라가며, 서로 잊음을 삶으로써 하고, 마침내 다하는 바가 없으랴"하고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 보고 웃으며, 서로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드디어 서로 더불어 벗이 되었다.
[원문]子桑戶 孟子反 子琴張 三人相與語曰 孰能相與於無相與 相爲於無相爲. 孰能登天遊霧 撓撓 無極 相忘以生 無所終窮 三人相視而笑 莫逆於心 遂相與友.
■ 만가 輓歌[수레 끌 만/노래 가]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 혹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
[내용] 한(漢)나라 고조 유방(劉邦)이 즉위하기 직전의 일이다. 한나라 창업 삼걸(三傑) 중 한 사람인 한신(韓信)에게 급습 당한 제왕(齊王) 전횡(田橫)은 그 분풀이로 유방이 보낸 세객(說客) 역이기(역食其)를 삶아 죽여 버렸다.
이윽고 고조가 즉위하자 보복을 두려워한 전횡은 500여 명의 부하와 함께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지금의 전횡도(田橫島)로 도망갔다. 그 후 고조는 전횡이 반란을 일으킬까 우려하여 그를 용서하고 불렀다.
전횡은 일단 부름에 응했으나 낙양을 30여리 앞두고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다. 포로가 되어 고조를 섬기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전횡의 목을 고조에게 전한 두 부하를 비롯해서 섬에 남아있던 500여 명도 전횡의 절개를 경모하여 모두 순사(殉死)했다.
그 무렵, 전횡의 문인(門人)이 해로가(해露歌) 호리곡(蒿里曲)이라는 두 장(章)의 상가(喪歌)를 지었는데 전횡이 자결하자 그 죽음을 애도하여 노래했다.
해上朝露何易晞 부추 위의 이슬은 쉬이 마르도다.
露晞明朝更復落 이슬은 말라도 내일 아침 다시 내리지만,
人死一去何時歸 사람은 죽어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해로가]
蒿里誰家地 聚斂魂魄無賢愚 호리는 뉘집 터인고, 혼백 거둘 땐 현우가 없네.
鬼伯一何相催促 人命不得少王? 귀백은 어찌 그리 재촉하는고, 인명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못하네.[호리가]
이 두 상가는 그 후 7대 황제인 무제(武帝:B.C.141∼87) 때에 악부(樂府) 총재인 이연년(李延年)에 의해 작곡되어 해로가는 공경귀인(公卿貴人), 호리곡은 사부서인(士夫庶人)의 장례 시에 상여꾼이 부르는 '만가'로 정해졌다고 한다 .
[참고]만가는 우리나라 구전 민요의 하나로서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이다. 따라서 구비 전승으로서의 민중 문학인 동시에 민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가는 전통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며 어느 면에서는 기록문학에 비할 수 없는 절실한 생활 그 자체이기도 하다. 만가는 쉽게 '상여소리', '상부소리', '영결 소리'라고 하며 또 향도가, 향두가, 상두가(喪土歌), 상두가(常頭歌), 해로가라고도 한다.
향도가란 신라와 고려 시대의 향도라는 일종의 신앙 단체에서 연유된 것으로, 불교와 무속의 두 요소가 내포된 단체가 부르는 노래였다.
김유신 장군의 화랑도를 일명 용화향도라고 한 것을 보면 신라의 화랑이 불교와 고유 신앙의 요소를 내포한 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려 숫종 때는 승려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만불회라는 신앙 단체가 있어서 그 모임에 든 사람을 만불향도라 했다. 그래서 향도란 요즘 단원이나 회원과 같은 말로, 죽은 사람들이 합창하는 상여노래를 향도가라 했다. 향도들이 상여를 운상하게 된 것은 맹인을 영천 영지에 극락시킨다는 신앙적 요소가 내포돼 있었다. 향도가 향두로 변음되어 향두가가 된 것이다.
상여의 낮은말로 상두(喪土)란 말이 있다. 여기서 '土'는 뿌리를 의미하는 뜻에서 '두'로 발음한다. 남의 것을 가지고 제 낯을 내는 사람을 비꼬는 속담으로 "상두술 낯내기"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처럼, 상여 소리를 '상두가'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상두가란 어휘가 생겼을 것이다.
해로가란 솔잎에 묻은 이슬에서 나온 말로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낱말이다. 여기서 '솔'은 소나무의 솔이 아니라 달래과에 속하는 다년초 식용 식물부추를 의미하는 호남 지방의 방언이다. 간밤에 내린 이슬이 부춧잎에 방울방울 맺혀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가장 먼저 떨어진다는 데서 허무한 인생을 비유한 것이다. 한나라 때 생긴 말로 주로 귀족 사회에서 쓰였다.
그리고 만가를 호남 지방에서는 상부가, 제주도에서는 답산가라 일컫는다. 상부가란 옛날 향약의 상부 상조에서 나온 말이요, 갑산가란 상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데서 그렇게 쓰인 것이다.
영어로 엘레지다. 즉 죽은 이를 위해서 애도와 비탄을 나타내는 노래나 시다. 이 'Elegy'는 그리스의 'elegos' 즉 갈대피리란 뜻으로서 당초에는 피리를 반주하는 만가의 일종을 지칭했으나 후에 심사나 명상 등을 싣는 데 적합한 시 형식을 지칭하게 되었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비탄의 감정을 나타내는 서정시를 지칭하게 되었다.
우리가 만가라 하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가사를 노래화한 것을 이른다. 만가에는 상여를 메고 묘지를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매장한 뒤에 흙을 다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특히 후자는 '달구지'라고 따로 말하기도 한다. 지금은 거의 소멸되었지만 봉분까지 환전히 다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산하지'라는 허전한 노래가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해남군과 고흥군 일부지역에서만 간긴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까지를 총칭하여 만가라 한다. < 한국만가집>
제공 : 세이버백과 (http://cybergosa.net) (다음에 계속)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