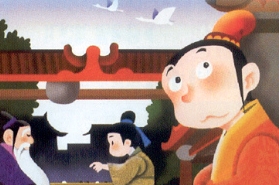| 故事成語- 문외한 門外漢[ | |
| 입력시간 : 2009. 08.20. 00:00 |   |
|
☞어떤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
■문일지십 聞一知十[들을 문/한 일/알 지/열 십]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안다. 매우 총명함.
[반] 得一忘十(득일망십)
[출전]『論語』 公治長篇
출처 :한자뱅크
[내용]공자의 제자가 3천명이나 되었고 후세에 이름을 남긴 제자가 72명이나 되지만 당시 재주로는 자공을 첫째로 꼽고 있었다. 실상 안회는 자공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나은 편이었지만, 공자가 말했듯이 그는 그러한 기색을 내보이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이기도 했다.
孔子는 子貢이 顔回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물었다.“자네와 안회는 누가 더 나을 것같이 생각되는가?”하니,“소생이 어찌 감히 안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는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알지만 소생은 하나를 듣고서 겨우 둘을 아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확실히 자네는 회를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없는 것은 자네만이 아니라 나도 회를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다네.”라고 하였다.공자는 자공의 솔직한 대답에 만족했다. 역시 자공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다.
■ 문전성시 門前成市[문 문/앞 전/이룰 성/장 시]
☞문 앞에서 시장이 이루어진다. 권세가나 부자집 문앞은 방문객들로 붐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집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함.
[동]門前若市(문전약시) : 문 앞이 시장과 같다./ 門庭若市(문정약시) : 집안의 뜰이 시장과 같다./ [반]門前雀羅(문전작라) : 문 앞이 새 그물을 칠 정도로 한적하다.
[출전]『漢書』 孫寶傳,鄭崇傳
[내용1] : 漢나라 애제(哀帝)는 약관(弱冠)의 나이로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외척이 정권을 쥐고 있어 꼭두각시에 불과하였지만 그에게는 정숭(鄭崇)이라는 어진 신하가 있었다. 처음엔 정숭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외척들의 저항이 점점 거세지자 귀찮아 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그 틈에 간신들이 기회를 잡고 그를 모함하니,「임금이 정숭을 꾸짖기를 그대의 집은 시장과 같다고 하니 어찌하여 짐(朕)과의 관계를 금하여 끊으려 하는가? 하니 정숭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의 집은 시장과 같으나 신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上責崇曰 君門如市이라하니 何以欲禁切主上이리오하니 崇對曰 臣門如市이나 臣心如水이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애제는 정숭의 말을 믿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결국 옥사하고 말았다.
[내용2]전국시대, 제(齊)에 추기(鄒忌)라는 호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추기는 거울을 보고 생각했다. "나는, 미남자로 유명한 서공(徐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다. "나와 서공과 어느 쪽이 미남자인가?"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틀림없이 당신 쪽이 더 잘 생겼습니다." 아내의 말은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추기는 첩에게도 꼭 같이 물었다. 첩은, "물론 당신이 더 잘 생겼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날, 친구가 찾아왔기에 추기는 친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추기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그 친구가 대답했다. "서공 따위는 자네에게 미치지 못하네. 정말이네!" 친구의 칭찬의 말에도 추기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서공이 추기의 집을 방문했다. 추기는 서공을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고, 또 뚫어지도록 서공을 보며 생각했다. "역시 내 쪽이 떨어진다." 서공이 돌아간 후에, 추기는 자신과 서공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자신이 서공보다 못생겼다고 생각되었다.
그 날 밤, 그는 생각했다. "왜 모두 내가 더 잘생겼다고 말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추기는 깨달았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첩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친구는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였다."라고. 자신이 이 지경이라면, 왕은 더 많은 아부의 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추기는 위왕(威王)을 알현하여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 칭찬하는 말보다, 비판하고 충고하는 말이야말로 들을 가치가 있다고 진언했다.
위왕은 그 말을 옳게 여기어 즉시 공포했다. "관리와 백성을 막론하고, 나에게 직간(直諫)하는 자에게는 상등(上等)의, 상서(上書)하여 간하는 자에게는 중등(中等)의, 마을에서 비판하는 자에게는 하등(下等)의 상을 준다." 예상대로, 왕에게 간언 하려고 온 자가 줄을 이었기 때문에, 왕궁의 뜰은 저자처럼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물론, 상서도 쇄도하였고, 마을에서도 왕을 비판하는 소리로 떠들썩하게 되었다. 왕은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개혁해 갔다.
수개월이 지났다. 비판자는 두드러지게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비판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비판의 씨앗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위왕은 이런 노력으로 제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였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모 두 제나라를 존경하여 사자를 파견했다. 역사가는 이것을 논평하여 말했다. "위왕은 군사를 사용하지 않고 승리를 얻었다."
[원문]上責崇曰 君門如市人 何以欲禁切主上 崇對曰 臣門如市 臣心如水 願得考覆
■ 문전작라 門前雀羅 [문 문/앞 전/참새 작/벌일 라]
☞문 앞에 새그물을 친다는 뜻으로, 권세를 잃거나 빈천(貧賤)해지면 문 앞 (밖)에 새그물을 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진다는 말.
[원]門外可設雀羅 [반]門前成市
[출전]『史記』〈汲鄭列傳〉/ 백거이(白居易)의〈寓意詩〉
[내용]전한 7대 황제인 무제(武帝) 때 급암과 정당시(鄭當詩)라는 두 현신 (賢臣)이 있었다. 그들은 한때 각기 구경(九卿:9개 부처의 각 으뜸 벼슬)의 지위에까지 오른 적도 있었지만 둘 다 개성이 강한 탓에 좌천면직재등용을 되풀이하다가 급암은 회양 태수 (淮陽太守)를 끝으로 벼슬을 마쳤다.
이들이 각기 현직에 있을 때에는 방문객이 늘 문전성시 를 이루었으나 면직되자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한다.
이어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급정열전(汲鄭列傳)〉에서 이렇 게 덧붙여 쓰고 있다.
급암과 정당시 정도의 현인이라도 세력이 있으면 빈객(賓客)이 열 배 로 늘어나지만 세력이 없으면 당장 모두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경우는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또 적공(翟公)의 경우는 이렇다. 적공이 정위(廷尉)가 되자 빈객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붐볐다. 그러나 그가 면직되자 빈객은 금새 발길을 끊었다. 집 안팎이 어찌나 한산한지 '문 앞(밖)에 새그물을 쳐 놓을 수 있을 정도[門外可設雀羅]'였다. 얼마 후 적공은 다시 정위가 되었다. 빈객들이 몰려들자 적공은 대문에 이렇게 써 붙였다.
한 번 죽고 한 번 삶에 곧 사귐의 정을 알고 [一死一生 卽知交情]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함에 곧 사귐의 태도를 알며 [一貧一富 卽知交態]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함에 곧 사귐의 정은 나타나네[一貴一賤 卽見交情]
■ 물아일체 物我一體 [사물 물/나 아/한 일/몸 체]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유]渾然一體
■ 물외한인 物外閑人[만물 물/바깥 외/한가할 한/사람 인]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지내는 사람. [유]遊遊自適
[참고]〈예장소요도〉는 소경인물산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 그림이 보통의 산수화와 다른 점이라면 화면 속의 인물이 대자연의 한 부분으로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의 자연 풍경과 적절한 비례치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그림을 처음 볼 때는 일단 산수를 그린 풍경화로 인식되지만, 세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물에 시선이 머물게 된다. 그러나 인물에 모아졌던 시선은 곧이어 다시 전체 풍경으로 옮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산수 자연과 인물이 상호 교섭 관계에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주변의 나무나 산 등 경물들은 비교적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는 작은 규모의 그림이지만, 나머지 여백 대부분이 안개로 처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유현(悠玄)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그윽한 산수 풍경 속에 신선처럼 소요(逍遙)를 즐기고 있는 한 선비의 모습이 무척 한가롭게 보인다.
<디지털 한국학>에서
제공 : 세이버백과 (http://cybergosa.net) (다음에 계속)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