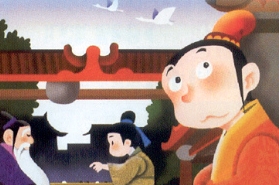| 故事成語- 삼강오륜 三綱五倫 | |
| 입력시간 : 2009. 11.09. 00:00 |   |
|
[해설]임금과 신하(君爲臣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부모와 아들(父爲子綱)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오륜(五倫)은 유교 실천 도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다섯가지의 인륜(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말한다.
삼강(三綱)은 유교 도덕이 되는 세가지 뼈대가 되는 줄거리로서, 임금과 신하(군위신강 君爲臣綱), 남편과아내(부위부강 夫爲婦綱), 부모와 아들 (부위자강 父爲子綱)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오륜(五倫)은 유교 실천 도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다섯가지의 인륜, 즉 군신유의 君臣有義, 부자유친 父子有親, 부부유별 夫婦有別, 장유유서 長幼有序, 붕우유신 朋友有信을 말한다.
이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5가지로,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道)는 친애(親愛)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인륜(人倫)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한다.
삼강오륜은 원래 중국 전한(前漢) 때의 거유(巨儒) 동중서(董仲舒)가 공맹(孔孟)의 교리에 입각하여 삼강오상설(三綱五常說)을 논한 데서 유래되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과거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되어 왔으며, 지금도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윤리 도덕이다.
■ 삼고초려 三顧草廬 [석 삼/돌아볼 고/풀 초/농막 려]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여러 번 찾는 것.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예를 다함. =초려삼고 [草廬三顧]
[유]토포악발(吐哺握髮):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우. 군주가 어진 인재를 예의를 갖추어 맞이함 / 편안함이 없이 몹시 바쁜 모양
[출전]《삼국지(三國志)》<촉지 제갈량전(蜀志 諸葛亮傳)〉
[내용]후한(後漢) 말기 관우(關羽:?~219)와 장비(張飛:166?~221)와 의형제를 맺고 무너져 가는 한(漢)나라의 부흥을 위해 애를 쓴 유비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허송 세월만 보낸 채 탄식하였다.
유비는 유표(劉彪)에게 몸을 맡기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관우와 장비와 같은 강한 군사력이 있으면서도 조조(曹操)에게 여러 차례 당하였다. 유비는 그 이유를 유효 적절한 전술을 발휘할 지혜로운 참모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유능한 참모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유비가 은사(隱士)인 사마휘(司馬徽)를 찾아가 유능한 책사를 천거해 달라고 부탁하자 사마휘는 “복룡(伏龍:초야에 묻혀 있는 재사)과 봉추(鳳雛) 가운데 한 사람만 선택하시지요”라고 말하였다.
유비는 복룡이 제갈 량임을 알고 그를 맞으러 장비와 관우와 함께 예물을 싣고 양양(襄陽)에 있는 그의 초가집으로 갔는데, 세 번째 갔을 때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제갈 량은 27세, 유비는 47세였다.
삼고지례는 유비가 제갈 량을 얻기 위해 그의 누추한 초가집을 세 번씩이나 찾아간 데서 유래하는데,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또한 인재를 알아 볼 줄 아는 안목도 또한 갖추어야 한다. 유비는 제갈 량을 얻은 이후 자신과 제갈 량의 사이를 수어지교(水魚之交:물고기가 물을 만난 사이)라고 말하였다. 제갈 량은 원래 미천한 신분으로 이곳에서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숨어 지냈다.
그는 스스로를 관중(管仲)과 악의(樂毅)에 비유하였지만 최주평(崔州平)과 서서(徐庶)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아 주지 않았다. 그는 뜻을 펼칠 때를 기다린 것이었다.
제갈 량은 이후 《출사표(出師表)》에서 자기를 찾은 유비의 지극한 정성에 대해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신이 비천한 신분임을 알면서도 싫어하지 않고 외람되게도 몸을 낮추어 제 초가집을 세 번씩이나 찾아 주어 당시의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감격하여 선제께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줄여서 삼고라고 하며, 삼고초려(三顧焦廬) 또는 초려삼고(焦廬三顧)라고도 한다. 비슷한 말로 삼고지우(三顧知遇)가 있다. [두산백과]
[참고] :「臣이 본래 벼슬이 없는 천한 몸으로 몸소 남양 땅에 묻히어 밭이나 갈면서 살고자 하여, 진실로 생명을 어지러운 세상에서 잘 보전하고 벼슬을 임금들에게 구하지 않고 지내려 하였더니, 선제께서 신을 벼슬이 없는 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외람스럽게도 몸을 굽히어 세 번이나 초가집의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 주시고 신에게 당세의 여러 가지 일을 물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마음에 크게 느껴 드디어 선제의 밑에서 일할 것을 허락을 하더니, 뒤에 나라가 기울 제를 만나서, 책임을 패하여 가는 군인의 즈음에서 받고, 명령을 어려운 사이에서 받음이 지금까지 二十一 년이 되니라.
[臣本布衣로 躬耕南陽하여 苟全性命於亂世하고 不求聞達於諸侯러니 先帝不以臣卑鄙하시고 猥自枉屈하사 三顧臣於草廬之中하여 咨臣以當世之事라 由是感激하여 遂許先帝以驅馳러니 後値傾覆하여 受任於敗軍之際하고 奉命於危難之間이 爾來二十一年의라.『출사표(出師表)』]
** 躬(몸소 궁) 鄙(더러울 비) 猥(외람될 외) 枉(굽힐 왕) 咨(물을 자) 激(분발할 격) 値(만날 치)
[참고] 삼고초려(三顧草廬)가 임금의 청을 받아 들인 것이라면 취직(就職)은 거절의 뜻을 표명한 말이다. 취직(就職)이란 말은 중국 진(晉)나라의 이밀(李密)이란 사람이 황제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의 가문이 출중치 못하다는 겸양(謙讓)을 발휘해 부름을 끝내 사양했다. 그는 자신의 명문집「문선(文選)」에서 이런 뜻을‘具以表聞辭不就職’이라는 글귀로 남겼다.
■ 삼년불비불명 三年不飛不鳴 [석 삼/해 년/아니 불/날 비/아니 불/ 울 명]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음. 웅비(雄飛)할 기회를 기다림
[동]불비불명(不飛不鳴), 복룡봉추(伏龍鳳雛:엎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 와룡봉추(臥龍鳳雛:누워 있는 용과 봉황의 병아리),용구봉추(龍駒鳳雛:뛰어난 말과 봉황의 병아리)
[유]자복(雌伏).[원] 삼년불비우불명 三年不飛又不鳴
[출전]『呂氏春秋 』 審應覽 / 『史記 』 滑稽列傳
[내용] 춘추시대 초엽, 오패의 한 사람으로 꼽혔던 초(楚)나라 장왕(莊王:B.C. 613∼ 591)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장왕은 신하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선언했다. "앞으로, 과인을 간하는 자는 사형(死刑)에 처할 것이오. " 그 후 장왕은 3년간에 걸쳐 국정은 돌보지 않은 채 주색(酒色)으로 나날을 보냈다. 이를 보다 못한 충신 오거(五擧)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언(諫言)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차마 직간(直諫)할 수가 없어 수수께끼로써 우회적으로 간하기로 했다.
"전하, 신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하나이다. " "어서 내보내시오." "언덕 위에 큰 새가 한 마리 있사온데, 이 새는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사옵니다[三年不飛又不鳴].' 대체 이 새는 무슨 새이겠나이까?"
장왕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3년이나 날지 않았지만 한번 날면 하늘에 오를 것이오. 또 3년이나 울지 않았지만 한번 울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오. 이제 그대의 뜻을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시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으나 장왕의 난행(亂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 소종(蘇從)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전에 나아가 직간했다. 그러자 장왕은 꾸짖듯이 말했다.
"경(卿)은 포고문도 못 보았소? " "예, 보았나이다. 하오나 신은 전하께서오서 국정에 전념해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알았소. 물러가시오. "
장왕은 그날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정에 전념했다. 3년 동안 장왕이 주색을 가까이했던 것은 충신과 간신을 선별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었다. 장왕은 국정에 임하자마자 간신을 비롯한 부정 부패 관리 등 수백 명에 이르는 반윤리적 공직자를 주살(誅殺)하고 수백 명의 충신을 등용했다. 그리고 오거와 소종에게 정치를 맡겨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로잡히자 백성들은 장왕의 멋진 재기를 크게 기뻐했다.
■ 삼라만상 森羅萬象 [빽빽할 삼/벌일 라/일만 만/본 뜰 상] ☞빽빽하게 벌여있는 온갖 존재, 우주의 온갖 사물과 현상을 뜻함
[출전] 법구경(法句經) [동]만휘군상 [萬彙群象]
[내용]'삼라와 만상은 하나의 법으로 새겨진 것이다' 삼라(森羅)는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듯이 우주에 펼쳐진 온갖 사물이고, 만상(萬象)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이나 형체이다. 따라서 삼라만상이라고 함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 형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삼라만상이 하나의 법으로 새겨진 것이라는 말은 우주의 수억 수만의 존재와 현상들은 각각이 다르게 존재하지만, 그것이 생성되고 존재하고 멸하는 이법은 하나이며 그 하나의 이법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원문]森羅及萬象 一法之所印
■ 삼령오신 三令五申 [석 삼/명령할 령/다섯 오/펼 신]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을 거듭 말함, 같은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명령하고 계고(戒告)함.
[출전] 『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내용]춘추전국시대 오(吳)나라의 제24대 왕 합려(闔廬:BC 515~496 BC)는 손무(孫武)의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읽고 나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래서 합려는 손무에게 한 번 시범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손자는 궁녀 180명을 모아 놓고 두 편으로 나누었으며, 궁녀들 가운데 합려가 가장 총애하는 두 명을 각각 대장에 임명하였다. 손무는 자신이 세 번 시범을 보인 다음 다시 다섯 번 설명하였다. 설명이 끝나자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하였으나 궁녀들은 웃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명령이 철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전적으로 지휘관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궁녀들로부터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다짐을 받았지만 두 번째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손무는 대장 두 명을 참수하려고 하였다. 왕이 극구 만류하였지만 손무는 "실전에서는 왕의 명령이라도 거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참수하였다. 그때서야 비로소 궁녀들은 손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훈련에 임하였다<두산백과>
■ 삼마태수 三馬太守 [석 삼/말 마/클 태/지킬 수] ☞청백리를 가리킴
[내용]한고을의 수령이 부임지로 나갈때나 또는 임기가 끝날때 감사의 표시로 보통 그 고을에서 가장 좋은 말 여덟마리를 바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 중종때 송흠(宋欽)이라는 분은 새로 부임해 갈 때 세 마리의 말만 받았으니, 한 필은 본인이 탈 말, 어머니와 아내가 탈 말이 각각 한필 그래서 총3필을 받아 그 당시 사람들이 송흠을 삼마태수라 불렀으니 청백리를 가리킨다.
참고로 고려 충렬왕 때는 임기가 끝나는 부사에게 7필의 말을 바치는 법이 있었는데 최석이라는 승평(지금의 순천)부사는 그 7마리의 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 받치려던 말이 망아지를 낳아 8마리의 말을 승평고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부민들이 최석의 뜻을 기려 비를 세웠는데 바로 팔마비(八馬碑)다. 지금도 순천을 팔마의 고장이라고 하여 청백리의 고장으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조선조에 와서는 세종때 맹사성은 공무를 수행할때도 말을 따고 다니지 않고 소를 타고 다니는 청백리로 유명하다
제공 : 세이버백과 (http://cybergosa.net) (다음에 계속)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