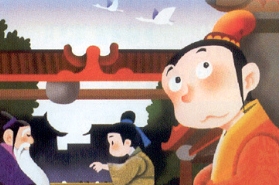| 故事成語-군자표변(君子豹變)등 3편 (241회) | |
| 입력시간 : 2012. 05.21. 00:00 |   |
|
표범의 가죽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처럼 군자도 뚜렷한 태도로 신속히 고쳐나감.
오늘날에는 태도나 입장을 예사로 바꾸는 것을 비난하는 말로, 또는 안면을 몰 수하는 소인들의 잡스러운 행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군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발견되면 아주 빠르게 그것을 개선시킨다. 마치 날랜 표범과 같이 . 이 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역경》으로 '군자는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데에 몹시 빠르고 그 결과는 표범의 무늬가 확실한 것처럼 외면에도 나타난다.'
大人虎變 (대인호변) 君子豹變 (군자표변) 小人革面 (소인혁면)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다. 그래서 산군(山君)이라고 한다. 호랑이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털갈이를 하는데, 털갈이가 끝난 호랑이의 털은 색채가 선명하고 아름답다. 호변(虎變)은 가을이 되어 호랑이의 털이 아름다워지듯이 세상의 폐해가 제거되어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뜻한다. 호랑이는 표범에 비해 모든 면에서 위다. 그런 이유로 대인은 효변한다.
표범도 가을이 되면 털이 바뀌지만 호랑이 털보다는 그 무늬가 작다. 조정의 군자들이 혁명의 마무리 사업에 노력하여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마치 가을에 새로 난 표범의 털처럼 아름답다는 것이 주역(周易)의 뜻이다.
소인의 경우는 군자처럼 자기 변혁을 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그릇된 방향을 바꾸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혁면(革面)이라 한다.
[출전]《易經》<혁괘사(革卦辭)>
◆금성탕지(金城湯池) 金:쇠 금. 城:성 성. 湯:끓을 탕. 池:못 지
쇠로 된 성곽과 그것을 둘러싼 열탕. 끓는 물에 둘러싸인 성이란 뜻으로, 방비가 아주 견고함.
진시황이 죽자 때를 같이하여 천하 각지에서 잠복하고 있던 여섯 강국의 제후와 종실들이 진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들은 제각기 왕이라 칭하고 군현의 책임자를 죽이는 등 기세가 거칠었다. 진나라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쳤다. 이때에 무신(武信)이라는 이가 조나라의 영토를 평정하고 스스로 무신군(武信君)이라 칭했다.
이때에 범양(范陽)에 사는 변설가 괴통이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범양 현령인 서공(徐公)이 방비를 굳혀 무신군에게 저항할 자세를 보이자 서공을 찾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십여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혹독한 진나라의 법을 시행했어요.
그 덕분에 몸이 상하거나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로 인해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졌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진나라의 위세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신을 죽여 원한을 풀려고 할 것입니다."
"방책이 없겠소?"
"나는 당신을 대신하여 무신군을 만나 당신께서 범양을 공격하여 현령이 항복했을 경우, 만약 그를 소홀히 대한다면 각국의 현령들은 손에 쥔 부귀를 놓치지 않으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를 충분히 하여 마치 '끓는 물에 둘러싸인 강철성(金城湯池)'처럼 견고하게 수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범양 현령들을 극진히 대접해 준다면 각국의 현령들은 앞다투어 항복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신군도 내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서공과 무신군은 괴통의 진언을 흔쾌이 받아들여 항복한 서공을 후히 대우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다른 30여 성도 속속 항복해 왔다. 이렇게 하여 범양 사람들은 전란의 소용돌이를 비켜 가게 되었다.
[출전]《漢書》<괴통전>
◆驥服鹽車(기복염거)驥:천리마 기. 服:복종할 복. 鹽:소금 염. 車:수레 거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준마가 헛되이 소금 수레를 끈다. 유능한 사람이 천한 일에 종사함
伯樂(백락)은 周(주)나라 때 사람으로 말을 감정하는데 도가 튼 名人(명인)이었다. 그가 훌륭한 말이라고 판정해 버리면 그 말 값이 하루아침에 열곱절은 쉽게 뛰었다. 그래서 伯樂一顧(백락일고)라는 말이 생겼다.
명마가 백락을 만나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 아무리 천리마라해도 백락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唐(당)나라 때의 명문장가 韓愈(한유)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 백락이 있고 나서 천리마가 있게 마련이다. 천리마는 언제나 있지만 백락은 항상 있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록 명마라도 백락의 눈에 띄지 않으면 하인의 손에 고삐가 잡혀 끝내는 천리마란 이름 한 번 듣지 못하고 보통말들과 함께 마구간에서 죽고 만다"
그런 백락이 어느날 긴 고갯길을 내려 가다가 명마 한 마리가 소금을 잔뜩 실은 수레를 힘겹게 끌고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분명 천리마인데 이미 늙어 있었다. 무릎은 꺾이고 꼬리는 축 늘어졌고 소금은 녹아내려 땅을 적시고 있었다. 무슨 사연이 있어 천리마가 이 꼴이 되었는가.
천리마도 백락을 보고는 '히힝' 하고 슬픈 울음을 울었다. 명마로 태어났으면서도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서러웠던 것이다. 백락도 같이 울면서 자기의 비단옷을 벗어 말에게 덮어 주었다.
천리마에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백락의 마음인들 오죽 아팠을까. 천리마는 땅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크게 우니 그 소리 하늘에 사무치더란 것이다. 이래서 '驥服鹽車'란 말이 나왔다.
[출전]《戰國策》
출처/http://peerhs.com.ne.kr/gosa/go1.html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