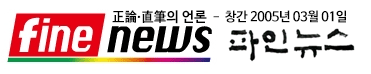|
| 2001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 (040)‘대마도는 우리땅’2001-06/26 <호매 時論>
(041)‘벌교’를 테마공원으로! 2001- 07/03 <호매 화요광장>
| | | | 입력시간 : 2015. 10.01. 00:00 |   |
(040)‘대마도는 우리땅’ 2001-06/26 <호매 時論>
■대마도는 우리땅
우리나라 가수 ‘아랑’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불러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노래는 ‘최동국 작사. 최동국 작곡 ’아랑‘이 노래하고 있다. "대마도는 우리 땅" 아~ 아~ 우리의 아리랑과 무궁화 꽃 노래가 항상 울려 퍼지는 곳”으로 시작한 이 노래는 하나의 가수가 부른 노래이기에 앞서 일본의 왜곡 교과서로 국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을 때 나온 탓으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래는 한국판과 일본 판으로 각각 부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 곡은 ”대마도는 우리 땅“ 일본 판은 ”韓國の つしま“로 되어 있다. 이 노래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바로 뒷 따랐다.
최유신이라는 네티즌은 ”드디어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된것같다“며 ”이 노래를 영문 판으로 만들어서 미 대통령이나 기타 전 세계로 전파를 시키자“ 고 하는 등 많은 네티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마도의 역사적 배경
대마도는 부산에서 53km, 일본의 규슈 혼도(九州本島)에서는 147km나 떨어져 있는 일본보다는 한국 쪽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그 크기는 거제도의 두배 정도 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살기 어려운 자연 조건이 척박한 섬으로써,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만 되는 섬이다.
'고려 시대' 중엽부터 '진봉선 무역(進奉船貿易) 체제' 하에서 대마도는 고려에 종속되어, 고려는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대마도 당관(對馬島 當官)'이라는 고려 관직과 '만호'라는 고려의 무관직을 주는 등정치, 경제적으로 대마도는 고려에 속했다.
그러나, 고려 말 역사적으로 고려와 대마도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대마도 사람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구'로 변질되어, 고려말 이후에 대마도는 왜구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연안 및 중국 남부 해안에서 많은 약탈을 행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왜구 근절의 목적으로 수 차례 대마도를 정벌하였고 이후 '수직왜인(受職倭人)제도 및 고려 시대의 진봉선 무역과 유사한 '세견선 무역' 등의 체제하에서 다시 대마도는 조선에 종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6세기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하여, 조선의 지리 및 실정을 정확히 아는 대마도는 '임진왜란 침략의 전진기지'가 되어, 이때부터 대마도는 '쓰시마'란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조선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대마도는 완전히 일본 정부에 편입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마도는 우리 땅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은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게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는 건국 직후인 1948년 8월에 대마도 반환 요구를 한 후 일본측에서 물의가 일자 9월에 다시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거듭 대마도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일본측의 항의와 당시 미국의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은 훨씬 시기적 연원도 깊고 자료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부터라도 대마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노력 및 전국민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며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는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 문제와 격리시켜서 ‘대마도’의 우리 땅 이라는 국제적인 문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041)바위를 뚫은 1인 시위의 힘 2001-06/30 호매 시론
■시위 문화의 변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은 바위를 뚫을 수 있다”한 방울의 물은 약한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한군데만 공략하면 그 힘의 위력은 엄청남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파도가 부딪히는 곳은 바위의 형태도 변한다.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50년이 넘으면서 변혁의 물결 속에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 시위다. 그 많은 시위중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한 지역적으로 시위의 양상은 달랐다.4.19도 그랬으며 5.18도 그러했다. 부,마 시위에서는 전 시민이 거리로 몰려와 대규모의 시위로 변하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도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민족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가 아닌, 집단 이기주의적인 시위 등은 군중이 많게 되어, 일반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고, 차가 막히고, 또 채류탄 가스가 남발해서 일반인들은 꺼려하고 피하려고 한다 즉 집단적인 뜻을 같이 하는 종류의 사람들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가두 행진을 한다던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토록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데도 변혁을 하려는 집단들은 집회를 한다.
■1인 시위의 효력
그러나 최근은 대규모 집단 시위를 대신해 1인 시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1인 시위는 말 그대로 혼자만이 말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는 시위이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로 국내가 한참 시끄러울 때 김영진 국회의원이 일본에 가서 혼자 앉아서 시위를 했던것과 같은 양상의 시위다.1인 시위는 교통의 방해도 없고 군중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척 평화스럽고 조용한 시위의 방법이다.남북정상회담.ND,같은 정세의 움직임을 올바른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기보다,왜곡보도로 민중들을 기만하고 있는 족벌 신문에 대한 응징. 민족정신까지 말살하려는 반민족 신문에 대한 시위가 해당 신문사 정문 앞에서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위 방법은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주최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사람씩 릴레이 시위를 벌여 온 것이다.조선일보 반대 사이트 우리 모두 대표는“원래 시위는 일주일간 잡혀 있었다. 하지만 시위를 가져가다 보니, 보이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그래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1인 시위가 필요했다”고 1인 시위가 길어진 이유를 밝혔다. 요사이 1인 시위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위가 되었다.조선일보 반대 1인 시위,박정희 기념관 반대 1인 시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토록 거창한 목적의 시위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의 1인 시위도 눈에 뜨인다.
■허가 안받는 1인 시위
소규모의 시위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 동안 많은 시위들이 일어났지만 대부분이 대규모의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집회를 하려고 해도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 모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2인 이상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법에도 걸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할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1인 시위야말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집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릴레이식으로 시위를 하면 장기간의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043)‘벌교’를 테마공원으로! 2001- 07/03 <호매 화요광장>
■조정래의 소설 ‘태백 산맥’
소설 속의 무대가 실제로 살아 숨쉬고 있는 그곳. 순천으로 넘어가는 진트재 못미처 현부자네 제각. 정하섭이 조계산 자락을 타고 내려와 돌담을 넘어 소화네집으로 숨어들어 사랑을 나누던 명당자리 그 곳. 염상구가 읍내 주먹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희한한 대결을 벌이던 철교며, 중도 방천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昭和다리.
그 소화 다리를 지나 위쪽의, 보물로 지정된 홍교(횡개다리), 중도 방천과 간척지, 회정리 일대, 역전앞, 5일장인 벌교 장터, 외서 댁이 몸을 던진 그 저수지, 겨울철에 제맛이 난다는 벌교 꼬막 맛, 민들레처럼 무수한 발길에 짓밟혀도 모질게 살아왔던 벌교 사람들, 그리고 조계산 품에 안겨 있는 순천 선암사와 민중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낙안읍성, 어둠을 헤치고 빨치산 하대치가 찾아와 무릎을 꿇은 율어로 가는 길목, 어느 산자락에 묻힌 염상진 대장의 무덤 .
■베스트셀러 ‘태백 산맥’
6.25를 거쳐 분단에 이르기까지 빨갱이로 매도된 채 뭇산에서 죽어 간 무수한 민중들의 삶을 다룬 이 작품은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부분을 우리의 민족 문학, 통일 문학의 탁월한 성과로 복원했다는 호평을 받은 대하소설로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자료 수집 기간 5년여, 원고 집필에 무려 6년여 세월이 소요됐다는 이 10권의 대작.
여기에는 염상진, 하대치, 안창민, 강동식, 정하섭, 김범우, 심재모, 서민영, 염상구, 들몰댁, 장터댁, 외서댁, 애절한 사랑의 주인공 素花 등 줄잡아 300여명이 넘는 인물이 살아 움직이며, 풍부하게 구사된 걸쭉한 남도 사투리와 그 시대 사회상의 재현이 소설의 현장감을 뒷받침한다.
한때 이적성 시비로 문제가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장 감명 받은 책으로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도 화제작이요 베스트셀러다.
■역사적 배경
太白山脈의 역사적 배경은 일제시대부터 6.25전후까지이다. 우리 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격변기로서 해방 이후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혼란의 틈을 타고 사회주의 이념이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되며, 시대적으로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봉건적 농경 사회 체제를 벗어나려는 시기로, 공간적 배경은 전남 벌교의 총체적 모습을 보여주려는 작품으로 지주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내 땅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과 한을 가지고 있는 소농들을 주축으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그네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적인 풍랑이 민중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주된 줄거리는 좌익 활동가들의 투쟁과 그 궤멸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매장 당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역사적 고발이며, 실천적 방법의 하나로 정당한 평가의 요구이기도 하다.
■마땅히 테마 공원으로
‘벌교’는 내 남편의 고향이자 ‘소설 태백산맥’의 본 고장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벌교’는 좋은 관광 상품을 썩히고 있다. 벌교는 테마 공원 뿐 아니라 , 역사의 고향이자, 자연의 보고이다. 부용산 노래비 .채동선의 교향. 최고 양질의 갯벌. 여기에서 자라는 짱뚱어. 또 꼬막. 그것뿐인가, 제석산의 수석. 그리고 그 유명한 세계의 주산왕이 태어났던 벌교상업고등학교. 오래도록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을 ‘벌교’를 ‘소설 태백 산맥’의‘ 테마 공원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