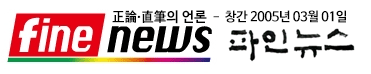|
| 故事成語-백두여신(白頭如新) 등 3편 (275회) | | 백룡어복(白龍魚服).백안시(白眼視 | | | | 입력시간 : 2013. 04.15. 00:00 |   |
◆백두여신(白頭如新)= 白:흰 백. 頭:머리 두. 如:같을 여. 新:새로울 신
머리가 파뿌리처럼 되기까지 교제하더라도 서로 마음이 안통하면 새로 사귀기 시작한 사람과 같다
추양(鄒陽)은 전한(前漢) 초기의 사람이다. 그는 양(梁)나라에서 무고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옥중에서 양나라의 왕에게 글월을 올려 사람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했다.
형가(荊軻)는 연(燕)나라 태자 단(丹)의 의협심을 존경하여, 그를 위해 진(秦)나라 시황제를 암살하러 갔었다. 그러나 태자 단도 형가를 겁쟁이라고 의심한 일이 한 번 있었다.
또 변화(卞和)는 보옥의 원석을 발견하여 초나라 왕에게 바쳤는데, 왕이 신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을 기만하는 자라 하여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발을 베는 형에 처했다.
이사(李斯)는 전력을 기울려 지나라 시황제를 위해 활동하고 진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나 마지막에 2세 황제로부터 극형에 처해졌다. 정말 백두여신(白頭如新) 말대로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제하더라도 서로 이해하지 못함은 새로 사귄 벗과 같다.
양나라 왕은 이 글을 읽고 감동하여 그를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상객으로 맞이해 후히 대접했다.
[출전]《史記》<鄒陽列傳>
◆백룡어복(白龍魚服)= 白:흰 백. 龍:용 룡. 魚:물고기 어. 服:입을 복
흰 용이 물고기의 옷을 입는다는 말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서민의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미행하는 것을 비유함.
오나라 왕이 백성들을 따라 술을 마시려고 했다. 이때 오자서가 간언하여 말했다.
"마셔서는 안됩니다. 옛날에 흰 용이 차가운 연못으로 내려와 물고기로 변한 일이 있습니다. 어부 예저는 그 눈을 쏘아 맞추었습니다. 흰 용은 하늘 위로 올라가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느님은, '그 당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흰 용은 대답하기를 '저는 차가운 연못으로 내려가 물고기로 변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말하기를, '물고기는 진실로 사람들이 쏘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예저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무릇 흰 용은 하느님의 귀한 가축이고, 예저는 송나라의 미천한 신하입니다. 흰 용이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면 예저 또한 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만승(萬乘)의 지위를 버리고 포의(布衣)의 선비들을 따라 술을 마시려고 하십니까? 신은 예저의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왕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또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장자> "잡편" '외물'에도 있다.
송나라의 원군이 밤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머리를 풀어 해친 한 남자가 쪽문으로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재로의 못에서 왔습니다. 청강의 사자로 하백에게 가다가 어부 예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원군이 꿈에서 깨어나 사람을 시켜 이 꿈을 점치게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건 신귀입니다."
그래서 원군이 어부 중에 예저라는 자가 있는지 물으니 과연 있었다. 원군은 예저를 조정으로 불러 들여 물었다.
"무슨 고기를 잡았느냐?"
"흰 거북이가 제 그물에 걸렸습니다. 크기가 사방 다섯 자나 됩니다."
원군이 그 거북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어부로부터 받은 거북을 죽여야 할 지 살려 주어야 할 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거북을 가르고 귀갑을 지져 72 번이나 점을 치니 길흉이 모두 들어맞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신귀는 원군의 꿈에 나타날 수 있었지만, 예저의 그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의 지력은 72 번의 점에 어긋남이 없을 정도였지만 창자가 도려내지는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다."
고대 우리나라 임금들도 화려한 곤룡포 대신 평민들의 옷을 갈아 입고 미행을 했었다. 임금의 미행은 무엇보다도 민심을 살펴 정사에 반영하려는 것이었다. 신하들이 보고하는 것만으로써는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출전]《史記》<오자서열전>
◆백안시(白眼視)=白:흰 백. 眼:눈 안. 視:볼 시.
흰 눈으로 보다는 뜻으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흘겨봄.
위진 시대(魏晉時代 : 3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노장(老莊)의 철학에 심취하여 대나무숲 속에 은거하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에 완적(阮籍)이 있었다. 완적은 여러 가지 책들을 널리 읽고, 술을 좋아했고, 거문고를 교묘하게 탈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예의 범절에 얽매인 지식인을 보면 속물이라 하여 '백안시'했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 조문객들이 와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상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물끄러미 손님들을 응시하고, 조문객에 대한 예절인 곡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기쁨과 성냄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검은 눈동자와 흰자위로 외면하였다. 통속적인 예절을 지키는 선비를 만나면 흰 눈으로 흘겨보았다.
어느 날 역시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의 형 혜희가 완적이 좋아하는 술과 거문고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나 완적이 흰 눈으로 흘겨보며 업신여기고 상대해 주지 않자 혜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도망가듯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혜강이 술과 거문고를 들고 찾아가자, 완적은 크게 기뻐하며 검은 눈동자를 보이면서(靑眼視) 환영했다.
이처럼 상대가 친구의 형일지라도 완적은 그가 속세의 지식인인 이상 청안시(靑眼視)하지 않고 '백안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야(朝野)의 지식인들은 완적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 몹시 미워했다고 한다.
백안(白眼)이란 눈의 흰 부분을 말하며, '사람을 싫어하여 흘겨보는 것' 또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백안시(白眼視)라고 말하게 되었다.
[반의어] 청안시(靑眼視). [출전]《晉書>〈阮籍傳〉
출처/ http://peerhs.com.ne.kr/gosa/go1.html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