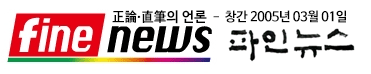|
| 故事成語一日如三秋(일일여삼추)등 2편 (319회) | | | | 입력시간 : 2014. 03.24. 00:00 |   |
◆一日如三秋(일일여삼추)= 한 일, 날 일, 같을 여, 석 삼, 가을 추
하루가 3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리는 마음이 애절함을 비유하는 말
三秋는 세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하나는 孟秋(맹추·음력 7월) 仲秋(중추·8월) 季秋(계추·9월)의 3개월로 보아야 한다는 것.
둘은 이 3개월이 세 번이므로 9개월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
셋은 모든 곡식은 가을이 되어야 익는데 가을은 1년에 한번뿐이므로 一秋(일추)의 세 번은 三秋, 곧 3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詩經(시경) 王風篇(왕풍편)에는 '采葛(채갈)'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저기서 칡을 캐고 있는 그대여. 하루라도 그대를 보지 못하면 석 달 동안이나 못 본 듯 그리워지네 (彼采葛兮 一日不見 如三秋兮)
저기서 쑥을 캐고 있는 그대여. 하루라도 그대를 보지 못하면 아홉 달 동안 못 본 듯 그리워지네 (彼采蕭兮 一日不見 如三秋兮)
저기서 약쑥을 캐고 있는 그대여. 하루라도 그대를 보지 못하면 삼년을 못 본 듯 그리워지네 (彼采艾兮 一日不見 如三秋兮)
이 시는 임을 그리워하여 단 하루를 보지 못해도 무척 긴 세월로 느껴진다는 애틋한 마음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一日三秋(일일삼추)는 원래 남녀간의 그리움을 뜻했으나 지금은 기다림의 대상에 관계없이 두루 쓰이고 있다. 一日三秋(일일삼추) 一刻如三秋(일각여삼추)라고도 한다.
《呂氏春秋順說》에 연경거종(延經擧踵)이라는 말이 있다. 목을 길게 빼고 발꿈치를 들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백난지중대인난(百難之中待人難)이란 했다. 수많은 일 중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뜻이다.
《左傳》에도 부질없는 기다림을 '하청봉명(河淸鳳鳴)'이라 하였다. 황하의 누런 황톳물이 맑아지고, 봉황새가 울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출전]《詩經》
◆일전쌍조(一箭雙雕)= 一:한 일. 箭:화살 전. 雙:둘 쌍. 雕:독수리 조
화살 하나로 독수리 두 마리를 떨어뜨리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취한다는 뜻으로 일거양득(一擧兩得)과 같은 말.
남북조(南北朝) 시대 북주에 장손성(張孫晟)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매우 영리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에 관한 지식이 깊은데다 특히 활쏘기에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어느 해 서북쪽에 있던 돌궐(突厥)왕으로부터 북주의 왕실과 혼인하기를 원한다는 전갈이 왔다. 북주는 이를 허락하고 장손성으로 하여금 공주를 호송하게 했다. 돌궐왕 섭도(攝圖)는 다재다능한 장손성을 좋아해서 그를 돌궐에 남아있게 하면서 사냥을 하러 나갈 때는 언제나 그를 데리고 갔다.
힘차게 활을 당겨 쏘는 장손성의 활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그를 벽력(霹靂)이라 했고 비호처럼 말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섬전(閃電:번쩍이는 번개)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섭도는 그를 일년동안이나 붙들어 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귀국하게 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바람처럼 날아가 다른 독수리가 입에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빼앗으러 하는 것을 본 섭도가 장손성에게 화살 두 대를 주면서 두 마리 모두 쏘아 떨구라고 했다. 장손성은 말 머리를 재빨리 독수리들이 다투고 있는 쪽으로 향해 쏜살같이 달리면서 활을 힘껏 당겼다.
그러자 눈깜짝할 사이에 두 마리가 땅에 떨어졌다. 하나의 화살에 두 마리의 독수리가 함께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장손성이 한 대의 화살로 두 마리의 새를 쏘아 떨어뜨린 것을 一箭雙雕라고 일컫게 되었다.
같은 뜻의 일석이조(一石二鳥)는 영어 속담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의 번역어다.
[출전]《수서(隋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