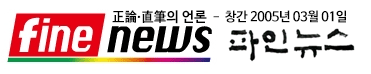|
| 2001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 (046) "먹을 만한 게 없다.?" 2001-7/14 <호매 토요광장>
(047)사라진 여성 戶主제 2001-07/23 <호매 시론> | | | | 입력시간 : 2015. 10.05. 00:00 |   |
(046) "먹을 만한 게 없다.?" 2001-7/14 <호매 토요광장>
■ 과거의 보리고개
50대를 넘은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춘궁기가 무엇인지도 안다.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 기억해 보자, 소나무 껍질 속의 얇은 껍질을 송키라고 하는데 배고프면 낫으로 두꺼운 것 껍질을 벗기고 속의 부드러운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그리고 논에서 자라는 자운영이나 독세라는 풀로 죽도 쑤어 먹고, 무우잎이나 배춧잎의 씨레기로 된장 풀어서 죽도 쑤어 먹은 시절이 50년이 겨우 넘는다. 그때의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르고 자랐다.
어른들이 그때를 이야기하면“그때는 어른들의 세계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일축을 해버린다.그런데 최근에 음식에 대해 “먹을 만한 게 없다”라는 표현을 곧잘 쓰는 하면, 직장인들도 점심시간 만 되면 “오늘은 무엇을 먹지?, 정말 먹을 만한 게 없네?” 라는 말들이 곧장 튀어나온다. 정말 먹을 만 한게 없어서 이일까?.
이런 말들이, 세계 이곳저곳 굶어 죽는 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아를 체험하자는 기아 체험의 구호를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일반적으로 빈국으로 알려진 짐바브웨니, 케냐니 이런 나라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얘기다.
■ 부족 상태의 호황?
지난해부터 우리 국민에게서 고기를 빼앗아 간 광우병과 구제역, 더불어 이번에는 홍콩에서 조류 독감이 유행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의 먹거리를 빼앗아 간 것이 바로 광우병과 구제역이다.
광우병으로 유럽 전역이 검은 연기에 휩싸일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종목은 바로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다. 대표적으로 수산업 업체들과 닭고기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한쪽은 울상인 반면 또 한쪽은 호황이다. 따라서 그렇게 즐겨 찾던 쇠고기와 돼지고기들을 먹을 수 없었으니 역시 ’먹을만한게 없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게 된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고기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피부에 닿고 있다.
■ 이제는 물 부족 ?
이 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물"부분이다. 지난 5월 초 수돗물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정수기 업체들과 수질 관련 업체들이 큰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또 환경이 오염되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마져도 오염되어 가는 사태로 ’물‘ 역시 이제 믿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수돗물도 믿지를 못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물 장사‘가 또 호황이다. 정수기의 판매와 렌탈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이 물 부족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또 수십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생수의 판매가 급증했고, 그와 관련 업체들은 물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 먹을만한게 많다.
그러나 꼭 그런것들이 고갈됐다고 해서 ’먹을 만한 게 없다‘ 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배 부르는 소리다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는 신토불이 음식들로 먹을만한게 너무도 많다. 수입 육고기만이 먹거리가 아니다. 韓牛와 토종돼지. 토종 닭.채소나 과일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아직도 물 사정이 그런 되로 괜찮은 편이다. 아껴쓰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충분히 물 부속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앞으로는 배부른 소리 ’먹을 만한 게 없다‘라는 표현은 사라져야 한다. 수입 쇠고기가 없어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얼마든지 신토불이 먹거리들이 많다.
(047)사라진 여성 戶主제 2001-07/23 <호매 시론>
■안방을 점령한 ‘여성천하’
최근 안방극장이 온통 ‘여성 천하’로 뒤덮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10시대 안방극장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사극이 장악해 버렸다. 시청률 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인 천하>가 <태조 왕건>을 누르고 1위로 부상했고 <명성황후>도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에서 말해 주듯 조선 시대에는 여성 호주가 존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연구된 재미있고 놀라운 논문이 있다. 서강대 사학과 박사 과정의 정지영(34)씨가 <조선 후기의 여성 호주 연구>라는 논문에서 “조선 시대 호적을 보면 수많은 여성 호주들의 이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발견은 과히 여성을 편시 했다던 기록을 여지없이 파괴한다.‘女必從夫(여필종부)니 ’여자가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 돼야 한다‘는 내용들이 전해진 바와는 전혀 딴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17세기까지는 여성의 호주 승계가 보편적으로서 이때까지는 우리 조상들은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리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성위주의 호주 승계는 18세기 이후에야 만들어졌다.
■여성 호주가 사라진 시대
그렇게 되면, 17세기 이전까지의 오랜 역사는 전통이 아니고, 18세기 이후 남성 위주의 호주 제가 오랜 美風良俗(미풍양속)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게 됐다..우리 나라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호적이 남아 있는 단성(현재 경남 산청)지역의 1678년부터 1789년까지의 호적을 살펴보면, 1678년경 이 지역 호적에는 전체 호주의 11.1%가 여성 호주였고, 남편이 사망했을 때 그 부인이 호주를 잇는 사례가 전체 호주 승계 형태의 93%였다. 이미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사는 여성도 호주가 됐다. 그러나 18세기초인 1717년 호적에서는 여성 호주가 6%로 내려갔고, 남편이 사망 한 뒤에 아내가 승계한 비율은 37%로 줄어들었다. 이 결과로, 18세기 이후에는 국가에서 각종 부역과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 남성들을 호주를 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 까닭이다. 그렇지만 아들이 어리면 어머니가 호주가 됐고, 어머니의 재산 관리권이나 상속권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 18세기 이후의 부계 사회
이 논문은 ‘여성 호주’라는 용어를 쓴 첫 연구이며 여성들의 흔적이 거의 없는 다른 사료와는 달리, 남녀가 똑같이 호적에 기록됐다“는 주장이다..특히 양반, 양민, 천민 등 여러 계층 여성의 생생한 삶에 대해, 조선 시대 남녀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논문이다. 17세기의 호적을 보면 자녀가 있는 남녀가 재혼했을 때 여성이 데리고 온 아이들만이 함께 살았다. 어머니의 양육권이 보호된 것이다. 또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죽은 뒤 친가로 돌아갔고 재혼도 했다. 재산상속 등 기대할 것이 있는 양반 여성들 일부는 수절했지만 양민들의 수절은 별로 없었다. 즉 `여자는 죽으면 시댁 귀신이 되고 과부는 은장도로 몸을 지키며 수절해야 한다'는 부계 강박관념도 이 실증적 연구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조선 시대의 호주제는 현재의 주민등록부처럼 실제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에 불과했다. 따라서 부계 혈통을 강조하는 현재의 호주제는 일본의 `이에(家)'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日帝(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20세기초에 도입한 것이 명백해 진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