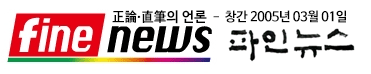|
| <고운석 칼럼>생존 전 대통령마다 범법자 | | | | 입력시간 : 2018. 04.05. 00:00 |   |
한국은 생존 전 대통령마다 부패의 마귀가 붙어선지 지옥(교도소) 으로 끌려간다. 이렇다보니 수백만 해외 교민과 외국인 상대 업무 종사자들이 낯을 들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개인적으로도 외국인을 만나기 두렵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 답해야 하나?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전원 법정에 서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러가지 부패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 선 그에게서 한 마디라도 양심의 소리를 기대했던 국민은 ‘역시나’하는 실망으로 입맛이 썼다.
그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하고픈 말은 많지만 참겠다”는 말을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날 그의 집사 김백준 피고인 말과는 너무 달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기소된 그는 첫 법정에서 발언권을 요구해 “제 죄를 변명하지 않겠으며,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아랫사람은 뉘우치는데,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은 혐의를 부정하는 모양새였다.
김백준 김희중 등 측근들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은 검찰에서 그의 혐의를 인정 또는 고발하는 진술을 했다.
그런데 본인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보복이라고만 말한다. 누구 눈에도 뻔해 보이는 혐의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없이 “그런 일 없다. 보고 받은 적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일, 모르는 일”이라고 응대해 스스로 의심을 키우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DAS(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MB의 형(이상은)이 그 회사 회장이고, 아들(이시형)은 전무 자리에 있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3월 13일 아들의 직함이 평사원으로 바뀌었다.
압수수색에서는 2010년 말 형의 지분을 아들에게로 몰래 이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프로젝트 Z’라는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제일 이상한 일은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한 일이다.
다스는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9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이중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사건 변호인은 미국의 유력 법무법인이었는데, 그 소송비용 60억원을 삼성 그룹이 대납했다. 이학수씨는 청와대 요청으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다스 압수수색 때 소송비 대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총무기획관 명의의 문건도 발견됐다.
이때 다스의 차명재산 관리내역이 담긴 외장하드 디스크도 나왔다. 일등 재벌이 왜 중소기업체 소송비용을 자진해서 대납했겠는가.
그해 말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관이 있으니까 뇌물아니냐는 게 검찰의 논리다. MB는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반면 다스의 전 현직 사장들은 “MB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다.
이 문제는 2007년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때 박후보 측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MB가 차명으로 서울 강남 도곡동에 금싸라기 땅을 차명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뒷날의 수사결과 이 땅은 1995년 263억원에 팔렸고, 다스 설립과 BBK투자금이 거기서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BBK 투자사기 사건 당시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는 1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다스 말고는 제대로 피해액을 되찾은 투자자가 없다.
BBK가 다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는 과정에도 청와대가 주 LA 총영사관 작용이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받은 일 대통령 당선 전후에 축하금과 인사 및 공사수주 청탁금 받은 혐의 등도 빠져 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아니라고만 한 모양이다.
늦었지만 사실대로 고백하고 참회한 김백분 메시지의 울림은 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다면 지금 같은 처지는 면했을지 모른다.
잘못은 시인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인정이다.
그래야 두 대통령 구속은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을 기대라도 했을 것이다.
/고 운 석 <시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