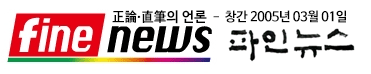|
| 이종범의 사림열전- 김일손(金馹孫)(1) | 그의 죽음은 하늘의 시샘이었다①
| | | | 입력시간 : 2008. 05.18. 00:00 |   |
김일손의 본관은 김해. 자, 계운(季雲). 호, 탁영(濯纓) 1464년(세조 10) 출생하였다.
김일손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덕과 기상을 타고났으며, 백성을 아끼는 성찰과 희망을 담아낸 문장으로 일세를 격동시켰다. 세상을 향한 포부와 소망은 웅대하고 간절하였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의로운 선후배 동료가 있어 서로 힘이 되었으며, 훗날의 재상감으로 기대한 성종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분주하였다.
김일손은 현실의 질곡과 훈구대신의 오만이 세조의 정변과 즉위가 빚어낸 어두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 또한 임금 앞의 번듯한 너스레가 부패와 탐욕을 숨기는 거짓의 세월을 언제 마감할까, 나아가 유자의 진정한 길과 관료의 참된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항상 고뇌하였다. 그만큼 고통의 길이었다.
김일손은 기억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고, 올바른 기록이 없으면 시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없다는 역사투쟁의 선봉이었다. 특히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전문을 실은 사건은 몰래 부르는 슬픈 기억의 노래를 내일의 희망을 위한 불멸의 서사로 오래도록 살린 쾌거였다.
우리는 김일손의 진실을 향한 기억운동을 신진사림파로 하여금 일시에 세력을 잃게 만든 섣부른 도전 혹은 모험주의로 폄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그가 아름다운 산수와 기암괴석, 심지어 화초조차 겉이 아니라 안에서 풍기는 빛을 찾아야 진정한 경관과 풍경이 되듯, 서화와 음률·문장도 한 개인의 재주이며 풍류이기에 앞서 소통과 공존, 진실과 화해의 마당에서 발휘되어야 제 구실을 한다는 새로운 문예관의 한 주인공임을 애써 눈감았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역사투쟁이 십대 중반부터 불의의 시대를 거부한 노(老)선비를 찾았던 배움의 길, 그리고 김시습과의 중흥사 회합으로 대미를 장식한 순례의 여정이 낳은 자각의 산물임을 아직도 모른 체하고 있다. 현실의 척박함, 학술의 가벼움이 아쉬울 따름이다.
1. 소통과 침묵
* 아름다운 현장
성종 21년(1490) 여름, 27살의 김일손은 고향인 청도에 있었다. 요동(遼東)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인 사이에 마찰이 있자 이를 단속하고 해명하는 질정관(質正官)으로 중국에 다녀온 포상으로 휴가를 얻었던 것이다. 마침 김굉필이 찾아와서 가야산 유관(遊觀)을 약속하였다.
가야산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웃 고을 영산(靈山)에 사는 부로들이 찾아왔다. 거의 5년을 재직하면서 헌신적으로 민생을 살펴 칭송이 자자한 전 현감 신담(申澹)을 위한 생사당(生祠堂)의 기문을 부탁한 것이다. 김일손도 진주향교 교수로 있으면서 신담의 치적을 익히 알았고, 그래서 성종 19년(1488) 신담이 이임할 때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한 적도 있었다. 「벼슬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신담을 전송하다」두 수가 있는데 다음은 첫 번째다.
금학만 가지고 맑은 바람 타고 떠나지만 琴鶴淸風遠/ 우리 백성에게 끼친 사랑 오래 남으려니 黔黎遺愛長/ 지금 그대 버리고 떠나지만 今君雖捨去/ 훗날 이곳이 동향이 되리라 他日是桐鄕
제1행의 금학(琴鶴)은 학을 그린 거문고만 가지고 떠난다는 청렴한 관리의 상징이며, 4행 동향(桐鄕)은 동성(桐城)고을에서 제 고장을 잘 다스린 주읍(朱邑)을 제 고을 사람으로 여기고 거짓 무덤을 만들고 사당을 지어 그리워하였다는 중국 한나라의 고사에 나온다. 신담도 훌륭한 정사를 행하였으니 영산 고을에서도 신담을 제 고향 사람으로 알아줄 것이다, 한 것이다.
이렇듯 신담의 치적을 흠모하고 칭송한 김일손이었지만, 아무래도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당을 짓고 여기에 자신이 기문 지어야 하다니, 참으로 어색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물의를 빚을 것 같았다. 그런데 영산의 부로는 이미 사당을 지어놓고 신담의 화상까지 그려놓고 강권하다시피 하였다. 결국 '신담의 생사당은 비단 한 고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하의 치세에 인재가 있어 풍속이 개화(開化)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기문을 남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붓을 들었다. 이렇게 마감하였다.
나를 낳은 것은 부모요, 나를 살린 것은 신후(申候)로세. 신후의 덕이여, 하늘이 만물을 낳음과 비길 만하네. 「영산현감신담생사당기(靈山縣監申澹生祠堂記)」
신담의 공적을 하늘의 생민(生民)에 비유한 것이다. 수령이라면 하늘과 같은 생민의 마음으로 백성을 어루만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만큼 간절하였음이겠지만, 지나침이 없지 않았다.
생사당 기문은 곧바로 물의를 일으켰다. 적지 않은 신료가 김일손을 탓한 것이다. 그러나 성종은 옹호하였다. "김일손은 문학(文學)하는 선비이니 반드시 망령되게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학은 요사이 문학의 뜻이 아니라 정치활동 및 영역의 본령으로서의 학술과 문장 즉 학문(學文)이다. 김일손에 대한 신임이었다. 그래도 지나친 과장이 있을지 모르니 진상을 조사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경상감사 김여석(金礪石)이 치계(馳啓)를 올렸다. 역마를 쉬지 않고 급히 올린 보고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 '고을의 사민(士民)은 이구동성으로 신담이 청렴하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였다고 하고, 특히 백성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흉년이었던 을사년(1485)에 신담은 음식을 짐바리에 싣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굶주리는 자를 만날 때마다 어루만지고 먹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자가 없었다.' 김일손의 기문과 다름없는 보고였다.
결국 물의는 진정되었다. 이때 성종이 말하였다. "신담이 끼친 사랑은 헛말이 아닌 듯하지만, 장래 폐단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분명 우려 섞인 질책이었다. 김일손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아아, 너무 가볍게 붓을 놀렸구나, 하였을 것이다.
* 풍경은 마음에 있다
김일손은 '이제 가야산으로 가야지' 하였다. 그러나 바로 갈 수 없었다. 새로 부임한 경상감사 정괄(鄭?)의 순행을 잠시 따르게 된 것이다. 스승 김종직과 절친한 사이인 데다 지체도 높은 감사의 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합천에 당도하니 수령이 객관 동북 편에 연지(蓮池)를 조성하고 호사스럽지도 누추하지도 않은 누각을 지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가 달이 뜨는 밤에 누각의 창에 매화나무가 비친다고 하여 매월루(梅月樓)라 이름을 짓고 김일손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김일손은 '매(梅)'를 '염매조갱(鹽梅調羹)'으로 풀었다. 상고시대 은나라의 고종(高宗)이 재상 부열(傅說)에게 명령하였다는 '그대가 만약 술과 감주를 빚으려면 네가 누룩과 엿기름이 될 것이며 만약 국에 간을 맞추려면 네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라'는 구절 후반에서 따온 것이다. 『서경』「열명편(說命篇)」에 있다.
그리고 '월(月)'의 의미는 『서경』「홍범(洪範)」에 나오는 무왕을 위한 기자의 충고 중 '왕은 한 해를 먼저 살피고, 높은 벼슬아치인 경사(卿士)는 한 달을 먼저 살피고, 낮은 벼슬아치 사윤(師尹)은 하루를 먼저 살피시라'는 구절에서 찾았다. '월'을 '경사유월(卿士惟月)'이라 한 것이다.
김일손은 '매월' 두 글자에서 무릇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여 국을 맛있게 하자면 소금과 매실과 같은 구실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한 달을 미리 헤아려 살펴야 한다는 뜻을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마감하였다.
꽃이나 새와 같은 깨끗한 아름다움을 조롱하고 맑은 빛을 탐내듯 좋아함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니, 매월이란 다만 가지고 놀며 탐할 물건이 아닌 것이다. 「매월루기(梅月樓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에 앞서 백성을 위한 좋은 정사가 있어야 진정 자연도 빛이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비유이며 소망이며 다짐이었다. 아무래도 감사와 수령은 조금 싸늘하게 들었을 것이다.
김일손은 풍경에 도취하는 가벼움을 경계하였다. 산하의 풍광도 인간과 함께 하였을 때, 또한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고 실천하였을 때 비로소 자연의 가치가 찬연히 빛난다는 생각이었을 게다. 죽령을 넘어 단양 장회원(長會院) 계곡의 이요루(二樂樓)를 찾았을 때였다.
이요루 가는 길은 실로 장관이었다. 김일손은 '가인과 이별하듯' 되돌아보며 갔다. 더구나 누각의 편액(扁額)이 안평대군 글씨였다. '찬연하기가 명월야광(明月夜光)과 같았다.' 지탱할 수 없는 환희에 젖었다. 그러나 한정 없이 풍경에 취할 수도 없었다. 공자의 '지자(知者)는 요수(樂水)하고 인자(仁者)는 요산(樂山)이라'는 가르침이 스쳤을 것이다. 동행한 단양군수 황린(黃璘)에게 토로하였다. "요산요수(樂山樂水)의 가르침을 모르고 산수에 빠져 지나치게 정을 두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닐까?"
「이요루기(二樂樓記)」에 속내를 풀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데로 흐르면서 암초 같은 장애를 만나면 피하는 물처럼 세상의 흐름과 사물의 이치를 살피고, 어진 사람은 풍상을 견디며 우뚝 솟은 산처럼 바른 생각을 굳게 지키며 한 뜻으로 세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술잔을 놀리고 음악을 들으며 '은연하게 솟은 것이 산이로세' 하고, '아련히 흐르는 바가 물이구나' 하면 요산요수(樂山樂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감하였다.
본성으로 타고난 인과 지를 제 몸으로 체득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좋은 뜻을 옮기지 않기를 '산의 고요함' 같이 하고, 한 곳에 얽히지 않기를 '물의 움직임'과 같이 한다. 이리하여 일심(一心)의 덕을 안돈하게 하고 만물의 변화에 두루 통하게 되는데, 이것이 요산요수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요루기」
아무리 풍경이 멋있어도 마음을 빼앗기면 자연에서 인간의 길을 배울 수 없으니 진정 산을 사랑하고 물을 좋아하려면 산처럼 물처럼 의리와 지혜를 체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산하의 경관도 바람처럼 변한다는 뜻을 담아 바람의 경관 즉 풍경이라고 한다. 그렇다! 진정한 풍경사랑은 풍경에 빠져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풍경과 함께 삶을 알차게 꾸미는 물아일체의 자아완성인 것이다
이종범<조선대학교 박물관장.교수>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